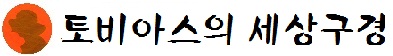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고려의 무신이었습니다. 변방 지역 출신에다 무인이었던 이성계는 아들 이방원이 문과에 급제하자 그렇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성계의 무술 실력은 무척 뛰어났다고 하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일화로 격구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격구는 말을 탄 채 숟가락처럼 생긴 막대기로 공을 쳐서 상대방 문에 넣는 경기입니다. 비슷한 경기로 서양에 폴로가 있습니다.
격구를 으레 말을 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걸어다니며 하는 보격구도 있습니다. 보격구는 넓은 마당에 구멍을 파놓은 다음 공을 쳐서 그 안에 넣는 방식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골프 같은 건가요?
고려 시대에 말을 타고 하던 격구가 조선 시대에 와서 걸어다니며 하는 격구로 변형된 거라 합니다.
무예로서의 기능을 생각하면 마상격구가 더 유용했을 것 같고, 경기의 재미나 박진감도 마상격구가 더 나았을 것 같습니다.
격구를 민간에서는 공치기 혹은 장치기라고도 불렀고, 중국에서는 타구打毬라고 했습니다. 조선에서 격구는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즐겼고, 임금님도 즐기고 백성도 즐기는 국민 스포츠였다 합니다.
마상격구는 조선시대에 중요한 무예로 취급되어 무과시험 과목에 포함되었고, 군대 열병식에서도 실시되었습니다.
세종은 "격구를 잘해야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할 수 있으며 창과 검술도 능란하게 된다."며 격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격구는 정조 때 편찬된 <무예도보통지>에도 24반 무예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격구를 즐긴 것은 삼국시대부터였을 거라고 하고, 고려때 국가적인 오락행사로 시행되었다네요. 특히 단오절에 궁중에서 성대하게 격구시합을 벌인 모양입니다. 이성계가 격구 솜씨를 뽐낸 것도 이 행사에서였겠지요?
이성계의 격구 실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성계가 공을 치며 나아가는데 공이 돌에 부딪쳐 되돌아오며 말의 앞쪽에서 뒤쪽으로 다리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순간 이성계가 몸을 뉘이더니 말의 꼬리쪽으로 빠져나가려는 공을 쳐서 앞다리 사이로 보낸 후 다시 공을 쳐서 상대방 문에 집어넣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또 한번은 공이 문에 맞고 튕겨나왔는데 말 왼쪽으로 날아왔습니다. 그러자 이성계는 오른발을 등자에서 빼 몸을 뒤쳐 내려 발이 땅에 닿기 전에 공을 맞춘 다음, 얼른 말에 올라타서 공을 쳐서 문에 집어 넣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묘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성계의 격구 실력에 대해서는 <용비어천가>에까지 그 사실이 묘사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왕의 명령을 받들어 공놀이하면서 말 옆에서 공을 가로막으니 도성 사람들이 모두 놀라도다."
용비어천가 자체가 왕을 추켜 세우는 목적으로 지은 글이긴 하지만 이성계의 격구 실력이 유난히 뛰어났던 것은 사실인가 봅니다.
그런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이런 실력을 가진 이성계가 큰일(!)을 도모하던 중 낙마 사고를 당해 위기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이성계는 공양왕 4년(1392) 3월 말에서 떨어져 위독한 상태가 되는데, 정몽주가 그 틈을 타 이성계 일파를 제거하려 한 것입니다. 정몽주는 대간을 시켜 조준, 남은, 정도전, 오사충, 조박, 남재 등이 붕당을 만들어 정치를 어지럽게 한다고 탄핵하게 한 다음 그 죄를 물어 귀양 보냈다가 극형에 처하려고 했습니다.
비록 다 망해 가는 나라였지만 고려에 대한 충정을 접을 수 없다는 정몽주였으니 고려를 뒤집어 엎으려 하는 사람들과 맞설 수 밖에요. 이에 이방원은 결국 조영규를 시켜 정몽주를 죽이게 됩니다.
'역사교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제주도의 옛이름 탐라는 무슨 뜻일까 (0) | 2021.09.19 |
|---|---|
| 태종 가로되, 사관이 알지 못하게 하라 (0) | 2021.09.19 |
| 단종실록과 노산군일기 (0) | 2021.09.19 |
| 서울에 남아있는 조선 5대궁궐 (0) | 2021.09.19 |
| 고려의 마지막 충신인가 조선의 개국공신인가, 그 갈림길에서 (0) | 2021.0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