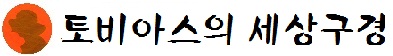제주도를 부르던 옛이름으로 탐라耽羅, 도이島夷, 영주瀛洲, 섭라涉羅, 탐모라耽牟羅, 탁라乇羅 등이 있습니다.
도이島夷는 섬나라 오랑캐라는 뜻인가요?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동이東夷라고 부른 거랑 같은 방식의 조어인가 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낯익은 것은 탐라, 지금도 많이 쓰이는 이름입니다. 제주산임을 입증하는 의미에서 상표에도 많이 쓰이고 제주도 가게 중에 탐라라는 이름을 붙인 곳도 많고요.
그럼 이 탐라라는 이름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그 답은 제주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고려사> 지리지 탐라현 항목을 보면 이렇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고려사> 번역본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라도의 남쪽 바다 가운데 있다.
<고기(古記)>에 나오는 기록은 이러하다.
태초에는 사람이 없었는데, 세 신인(神人)이 땅으로부터 솟아 나왔다. 그 구멍이 주산인 한라산 북쪽 기슭에 있는데, 모흥(毛興, 지금의 삼성혈)이라고 한다. 맏이는 양을나(良乙那), 그 다음은 고을나(高乙那), 셋째는 부을나(夫乙那)라고 했다. 세 사람은 거친 땅에서 사냥을 하며 가죽옷을 입고 고기를 먹었다.
하루는 자주색 진흙으로 봉해진 나무 상자가 바다에서 떠다니다 동쪽 바닷가에 닿았다. 가서 열어보니 상자 안에 돌로 된 상자가 있었으며, 자주색 옷에 붉은 띠를 두른 사자使者가 따라나왔다. 돌상자를 여니 푸른 옷을 입은 처녀 세 사람과 여러 구독(駒犢, 망아지와 송아지)과 오곡의 종자가 나왔다.
사자가 "우리는 일본국의 사신입니다. 우리 왕이 이 세 딸을 낳고는, '서쪽 바다 가운데의 산에 신인 세 사람이 내려와 장차 나라를 열고자 하나 배필이 없구나' 하고는 저에게 세 딸을 모시고 여기로 가라고 하셨습니다.'라고 말한 후 홀연히 구름을 타고 가버렸다.
세 사람은 나이 순서에 따라 세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세 사람은 샘물 맛이 좋고 땅이 비옥한 곳으로 가서 화살을 쏘아 땅을 정했는데 양을나가 사는 곳을 제일도(第一都)라 하였고, 고을나가 사는 곳을 제이도(第二都), 부을나가 사는 곳을 제삼도(第三都)라 하였다. 처음으로 오곡을 파종하고 또 가축을 길러 나날이 부유하고 자손이 번성하게 되었다.
15대손 고후(高厚) 고청(高靑)때 형제 세 사람이 배를 만들어 타고 바다를 건너 탐진(耽津, 지금의 강진)에 이르렀다. 이때는 신라가 융성하던 시절이었다. 마침 객성(客星)이 남방에 나타나자 태사(太史, 천문과 역법을 관장하는 관리)가 다른 나라의 사람이 찾아와 조회할 조짐이라고 보고했다.
세 사람이 신라에 조회하니 왕이 가상히 여겨 큰아들을 성주(星主)라 부르고, 둘째 아들을 왕자(王子)라 불렀으며, 막내아들을 도내(都內)라 불렀다. 큰아들을 성주라 한 것은 객성이 움직였기 때문이고, 둘째 아들을 왕자라 한 것은 왕이 고청으로 하여금 자기 바지 아래로 나오게 한 후 자식처럼 사랑했기 그렇게 이름 지은 것이다.
고을 이름을 탐라(耽羅)라 하였는데, 이들이 왔을 때 처음에 탐진에 정박하였기 때문이다. 각기 보개(寶盖)와 의대(衣帶)를 하사하고 돌려보냈다.
이로부터 자손이 번성하고 나라를 정성껏 섬기면서 고(高)씨가 성주가 되고, 양(良)씨가 왕자가 되며, 부(夫)씨가 도상(徒上, 도내)이 되었다. 뒤에 ‘양(良)’을 ‘양(梁)’으로 고쳤다.


고려사 탐라현 부분
고려사 기록은 고려말에 최영 장군이 목호의 난을 진압한 내용까지 이어지지만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세 신인이 땅으로부터 솟아나온 곳을 모흥이라고 했습니다. <탐라순력도> 중 '제주조점'을 보면 제주성 남쪽 밖에 모흥혈이 보입니다. 보통은 그림(지도)에서 위쪽이 북쪽이지만 이 그림은 한양에서 바라보는 방향으로 그렸기 때문에 위가 남쪽이 됩니다. 모흥혈은 지금 삼성혈로 불립니다.

<탐라순력도> 제주조점 일부

삼성혈
▼ 삼성혈 둘러보려면 클릭!!
나무상자가 떠내려와 닿았다는 바닷가는 지금의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입니다. 온평리에 세 신인의 결혼 이야기와 관련된 유적지 혼인지가 있습니다.

혼인지
바다에 떠내려온 상자에서 나왔다는 구독은 망아지와 송아지라는 뜻인데 가축을 의미한다고 봐야겠지요.
오곡은 주식으로 삼는 다섯 가지 곡식을 말합니다. 오곡의 구체적인 종류는 시대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보통 쌀, 보리, 조, 콩, 기장을 말하고 온갖 곡식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세 신인이 사냥을 하며 살았는데 바다 너머에서 온 공주들이 가축과 곡식 종자를 가져왔다는 것은, 수렵 사회에서 농경 사회로 넘어감을 뜻하는 거겠지요.
세 신인이 화살을 쏘아 정했다는 땅들은 마을 이름에 남아 전합니다. 제주시에 일도동, 이도동, 삼도동이라고 있습니다.
그때 화살에 맞았다는 돌과 그 사실을 기리는 삼사석비가 화북동에 있습니다. 조선시대 기록에 삼사석에 관한 내용이 보입니다.
관찬 지리지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시사석(矢射石)이라 하여 "주 동쪽 12리에 있다. 고로들이 전하는 말에, '삼성(三姓)이 터를 정할 때에 활을 쏜 것인데, 지금도 쏜 자국이 아직 남아있다.' 하였다."라고 적었고
제주목사를 지냈던 병와 이형상이 제주 지역의 역사와 지리 등을 기록한 <남환박물>에는 "제주성 동쪽 11리에 있다. 세속에서 전하기를, 삼성이 땅을 점칠 때 활로 쏘아 맞힌 돌이라 하는데 지금까지도 살을 쏜 흔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삼사석비는 1735년 제주목사 김정이 세웠습니다.

삼사석비
고후와 고청이 신라에 갔을 때 나타났다는 객성은 말 그대로 손님별, 일시적으로 보이는 별입니다. 혜성, 신성, 초신성 등을 말합니다.
이렇듯 여러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기록 속에 탐라라는 이름의 의미 또한 적혀 있습니다.
제주 개국시조의 15대손인 고후, 고청 왕자가 신라에 조회하자 고을 이름을 탐라로 했다는 것,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은 왕자들이 찾아올 때 탐진에서 처음 머물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탐진은 전라남도 강진의 옛 이름입니다. 신라의 왕경인 경주와는 꽤 거리가 있는 곳인데 이곳으로 상륙한 것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제주도와 육지를 잇는 뱃길은 이 길이 정석인가 봅니다. 이후 역사에서도 제주도와 육지를 잇는 뱃길은 전라도를 통합니다. 전남 강진에는 제주도에서 배에 실려온 말들이 내린 곳이라고 해서 마량이라고 불리는 포구도 있습니다. 하긴, 지금도 제주 가는 배가 주로 뜨는 곳은 전남 지역이네요.
'역사교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인왕제색도와 승정원일기의 날씨 기록 (0) | 2021.09.19 |
|---|---|
| 객사에 모셔둔 전패는 왕을 상징하는 것 (0) | 2021.09.19 |
| 태종 가로되, 사관이 알지 못하게 하라 (0) | 2021.09.19 |
| 화려한 격구솜씨를 뽐냈던 태조 이성계 (0) | 2021.09.19 |
| 단종실록과 노산군일기 (0) | 2021.0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