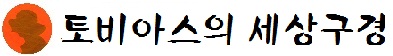조선은 역사를 중시하는 유학의 나라답게 방대한 역사기록을 남겨 놓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실록은 역대 왕별로 편찬되어 있습니다. 실록은 왕이 돌아가시면 실록청을 설치하고 편찬하는데, 이때 가장 기초가 되는 기록은 사관이 평소 작성해 놓은 사초입니다. 여기에다 승정원일기 같은 국가 기록은 물론 필요하면 개인이 가진 기록도 참고를 합니다.
사극에 보면 어전회의 때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는 사람이 꼭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사관이지요. 사관과 함께 승정원 주서도 어전회의에 참석해 기록을 남깁니다.
사관은 늘 왕을 따라다니며 왕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록합니다. 아주 꼼꼼하게 말이지요.
사관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은 왕이 뜰을 산책하다 급하게 소피가 마려웠습니다. 뒷간은 너무 멀고 소피는 마렵고, 결국 왕은 체면불구 노상방뇨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왕을 졸졸 따라다니던 사관이 이것을 기록합니다. 심지어 볼일을 본 후 임금께서 몸을 부르르 떠시었다,라는 것까지 덧붙여서요.
임금이 기가 막혀서 한 마디 합니다.
"뭘 그런 것까지 적느냐?"
그러자 사관이 또 붓을 움직여 이렇게 적습니다.
'뭘 그런 것까지 적느냐고 하시었다.'
사관이 얼마나 꼼꼼하게 기록했는지 보여 주는 이야기인데, 이 정도였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예를 든 건지, 실제로 있는 기록인지는 모르겠네요 ㅎㅎ
물론 이렇게 자세히 적었다고 해서 모월 모일 어디에서 볼일을 봤다는 내용까지 실록에 실리기야 하겠습니까만.
역사 기록의 중요성을 인정해서 국가 사업으로 실록을 편찬하고 사관이라는 관리도 두었지만 왕으로서는 이 사관이 영 껄끄럽고 거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관을 좋아한 왕은 없는 듯한데, 특히 태종 이방원은 사관을 몹시 싫어했다고 합니다.
한번은 태종이 편전에 있다가 사관 민인생閔麟生이 들어오자 편전까지는 들어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자 민인생이 역사에 남을 명언을 남깁니다. 그 일이 태종실록에 기록되어 전합니다.
태종실록 1년 4월 29일 기사입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편전에는 들어오지 말라."
인생이 말하기를,
"비록 편전이라 하더라도, 대신이 일을 아뢰는 것과 경연에서 강론하는 것을 신 등이 만일 들어오지 못한다면 어떻게 갖추어 기록하겠습니까?"
임금이 웃으며 말하기를,
"이곳은 내가 편안히 쉬는 곳이니, 들어오지 않는 것이 가하다. 사필(史筆)은 곧게 써야 한다. 비록 대궐[殿] 밖에 있더라도 어찌 내 말을 듣지 못하겠는가?"
이에 인생이 대답하였다.
"신이 만일 곧게 쓰지 않는다면 위에 하늘이 있습니다."
자기를 내친다 해도 그 위에 하늘이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하늘이 다 지켜보고 있어, 이 말이지요.
이쯤 되면 세상에 무서울 것 없는 태종 이방원도 사관 앞에서는 꼼짝 못할 수밖에요.
오죽하면 사냥을 하다 말에서 떨어졌을 때 태종이 가장 먼저 한 말이
"이 일을 사관이 모르게 하라."
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전해지는 걸 보면 결국 사관 귀에 들어간 모양입니다.
호기심에 찾아보았더니 진짜로 조선왕조실록에 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종실록
태종실록 4년 2월 8일
임금이 사냥하다가 말에서 떨어졌으나 사관에게 알리지 못하게 하다
親御弓矢, 馳馬射獐, 因馬仆而墜, 不傷 顧左右曰 : "勿令史官知之."
친히 활과 화살을 가지고 말을 달려 노루를 쏘다가 말이 거꾸러짐으로 인하여 말에서 떨어졌으나 상하지는 않았다.
좌우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사관(史官)이 알게 하지 말라."
말에서 떨어진 왕이 가장 먼저 한 말이 사관이 모르게 하라니, 풋 웃음이 터집니다.
이런 실록 기사를 보니 재미있기도 하고, 감탄도 터집니다.
그런데 태종이 이 낙마 사고로 다친 것도 아니고 별일 아닌 해프닝일 뿐인데 왜 실록에 남겨 두었을까요? 수많은 자료 중에 골라서 기록하는 실록에 말입니다. 아마도 사관에게 알리지 말라는 그 말 때문이 아니었을까, 왕의 행적은 어떻게든 역사에 남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 아닐까, 혼자 짐작해 봅니다.
'역사교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객사에 모셔둔 전패는 왕을 상징하는 것 (0) | 2021.09.19 |
|---|---|
| 제주도의 옛이름 탐라는 무슨 뜻일까 (0) | 2021.09.19 |
| 화려한 격구솜씨를 뽐냈던 태조 이성계 (0) | 2021.09.19 |
| 단종실록과 노산군일기 (0) | 2021.09.19 |
| 서울에 남아있는 조선 5대궁궐 (0) | 2021.0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