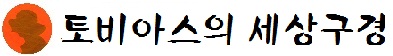옛 관아 구조를 보면 꼭 있는 시설 중 하나가 객사입니다. 다른 말로 객관이라고도 하는데 객사客舍든 객관客館이든 글자 그대로만 보면 손님이 머무는 집입니다.
관아에 와서 머물 정도의 손님이라면 나랏일을 보러 온 관리입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관리가 머물기도 하고, 관찰사(지금으로 치면 도지사)가 관할 구역을 돌아볼 때 머물기도 합니다.
그런데 객사는 숙소로서의 용도도 물론 있지만, 왕권을 상징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객사 입구에는 홍살문이 서있습니다. 홍살문은 문살을 붉게 칠한 것으로 신성한 장소를 보호한다는 의미를 가진 시설입니다. 문과 연결된 담장이 없는 걸 보면 출입을 위한 여타 문과는 다른 거지요.

순천 낙안읍성 객사 앞의 홍살문

순천 낙안읍성 객사
객사는 위치부터가 남다릅니다. 수령이 집무를 보던 동헌보다 더 중요한 곳에 있습니다. 상석이라고나 할까요.
객사 건물 구조를 보면 3채가 한데 붙은 듯한 모습입니다. 가운뎃채가 더 높이 솟아서 좌우로 급이 더 낮은 채들을 거느린 듯합니다. 관리들이 숙소로 사용하는 곳은 양쪽 공간이고 가운데 대청으로 된 공간에는 왕을 상징하는 전패殿牌 혹은 궐패闕牌를 모셔 둡니다.

나주목 관아의 객사인 금성관
전패는 왕의 초상을 대신해서 모셔둔 나무패입니다. 전殿 혹은 궐闕자를 새겨 놓아서 전패, 궐패라고 합니다. 목사, 군수, 현감 같은 지방관들은 부임지에 도착하면 이 전패 앞에 가장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고을을 떠났다 돌아올 때도 전패, 궐패에 인사를 드렸다네요. 집에서 부모에게 인사 드리듯 왕(을 상징하는 상징물)에게 문안 여쭙는 셈입니다.
지방 수령들은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도 전패를 향해 절하는 망궐례를 했고, 1월 1일인 정조, 동지, 왕의 탄신일에도 망궐례를 행했습니다. 지방에 있어 왕을 직접 뵐 수 없으니 왕을 상징하는 전패에 대고 예를 갖추는 겁니다.

낙안읍성 객사의 전패
조선이 일본과 정식 외교관계를 맺지는 않고 동래부(부산)의 왜관에서 무역만 허락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일본 대표들이 부산포에 도착해 가장 먼저 간 곳은 초량객사였습니다. 일본 대표들은 이곳에서 전패 앞에 예를 올린 뒤 동래부사와 외교문서를 주고받았습니다.
정식 외교 관계가 아니라 왕에게 직접 인사를 할 수는 없지만 왕을 상징하는 전패 앞에서 예를 갖추기는 한 겁니다.
객사는 명칭만 보면 손님이 머무는 집이고 실제로 그 용도로 쓰이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역할은 임금이 머무는 궁궐을 상징하는 건물이었던 셈입니다.
한 예로, 조선시대 이원진이 제주도에 대해 기록한 <탐라지>에는 제주목 객사인 영주관이 궁실宮室 편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객사가 궁궐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신성시되고 전패가 왕을 상징하는 대상이니 전패를 훼손하는 일은 대역죄에 해당됩니다. 재밌는 것은 이 사실을 역이용해서 지방 아전들이 수령을 음해하려고 전패를 훼손하는 일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어째서인지 정조 9년(1785년) 새로 편찬된 <대전통편>에서는 전패가 훼손되더라도 수령에게 죄를 묻지 않도록 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전패를 훼손한 자는 당연히 처벌을 받았고요.
그런데 어떤 아전이 법이 바뀐 것을 모르고 수령을 골탕 먹이려고 전패를 숨겼다 헛탕을 쳤고, 이 과정에서 전패가 긁히는 바람에 외려 본인이 처벌을 받은 일도 있다는군요.
'역사교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승정원일기는 누가 썼을까 (0) | 2021.09.19 |
|---|---|
| 인왕제색도와 승정원일기의 날씨 기록 (0) | 2021.09.19 |
| 제주도의 옛이름 탐라는 무슨 뜻일까 (0) | 2021.09.19 |
| 태종 가로되, 사관이 알지 못하게 하라 (0) | 2021.09.19 |
| 화려한 격구솜씨를 뽐냈던 태조 이성계 (0) | 2021.0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