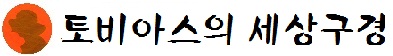우리나라 문화재 중 승정원일기(국보 303호)는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승정원일기는 조선시대 승정원에서 매일 처리한 업무 내용과 사건, 문서 등을 기록해 놓은 일기입니다.
즉 승정원의 업무일지인 셈입니다.
승정원일기는 조선이 건국된 이후 계속 작성되었지만 전기의 것은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졌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승정원일기는 인조가 임금이 된 1623년부터 마지막 임금인 순종이 물러나는 1910년까지 작성된 것입니다.
288년 = 10만 5천여 일 동안 작성된 것으로 모두 3,243책입니다.
여기서 '책'이란 옛날 책들을 세는 단위로 지금 단위로 하면 '권'에 해당합니다.
옛날 책에서도 권이라는 단위를 썼지만, 지금의 권과는 달리 내용상 구별되는 단위였습니다.
그래서 1책이 2권이나 3권으로 구성되기도 하는 식이었습니다.

승정원이 하는 일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왕명출납, 그러니까 왕의 비서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왕이 처리하는 업무는 모두 승정원에서 관리하는데, 각 관청에서 임금에게 올리는 보고서를 정리해 올리고,
왕이 그 보고서를 보고 내린 답이나 의견을 다시 문서로 만들어 각 관청으로 내려 보냅니다.


천계3년 3, 4, 5월 승정원일기 겉표지와 속지 모습입니다.
천계3년은 간지로는 계해년이고, 서기로는 1623년, 인조가 즉위하던 해입니다.
승정원의 핵심 구성원은 승지들입니다.
승정원에는 6명의 승지들이 있었고 그 중 책임자를 도승지라고 했습니다.
승지 6명이 모두 당상관이었으니 꽤 직급이 높은 관청인 셈입니다.
그렇다고 승정원에 승지들만 있었을 리는 없고, 주서와 서리들이 업무를 도왔습니다.
승정원의 업무일지를 작성한 사람도 승지가 아닌 주서였습니다.
주서注書는 승정원에서 수신하거나 발신하는 문서들을 정리하고,
왕과 중신들이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여해서 그 내용을 기록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조선시대 왕이 신하를 만날 때에는 반드시 승지가 동석했고, 이때 승지가 꼭 데리고 오는 사람이 주서였습니다.
왕과 신하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기록하기 위해서입니다.
임금 곁에서 모든 상황을 기록하는 사람은 사관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관과 함께 승정원의 주서도 왕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을 일일이 기록했던 겁니다.
이런 업무 성격 때문에 주서는 겸사관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맡은 일이 막중하다 보니 주서는 정7품으로 결코 높은 벼슬이 아님에도 자격 요건이 엄격했습니다.
주서는 문과 급제자만 임용되었고, 조상 덕에 벼슬에 오른 음관은 임용될 수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왕과 대신들의 대화 내용을 기록하려면 말로 하는 내용을 뜻글자인 한문으로 적어야 하는데
웬만한 글실력으로는 힘들었을 겁니다.
주서는 현장에서 초서로 속기해 놓은 내용을 공식 업무가 끝난 뒤 정리해서 일기를 작성했습니다.
일기를 작성할 때에는 먼저 날짜와 날씨를 쓰고, 승지들과 주서의 이름과 함께 출결 상황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왕을 비롯해 대비, 중전, 왕세자 등의 안부를 적은 뒤, 임금의 하루 일과를 장소와 시간대별로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기에 적을 때 어떤 업무를 어떻게 처리했다 하는 식으로만 적는 게 아니라
업무 처리에서 오간 온갖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부서간 오간 서류를 복사해서 함께 철해 놓은 것인데,
당시에 복사기가 있었을 리 만무하니 사람 손으로 일일이 베껴서 적어 놓은 겁니다.
내용을 그대로 적어 놓아야 하는 것 중에는 상소문도 있습니다.
승정원에서는 왕에게 올라오는 상소를 있는 그대로 베껴 놓아야 했습니다.
문구를 바꾸거나 내용이 길다고 짧게 요약하는 것은 당연히 금지했습니다.
간혹 만인소라고 해서 수천 명이 연명으로 상소를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모두 수록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필사 작업만 해도 엄청났을 텐데, 이런 단순작업(?)은 말단 관리인 서리들이 맡았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일기는 한 달 단위로 정리해서 책으로 엮어 보관했습니다.
분량이 많을 경우에는 두 책으로 엮었고, 윤달의 일기는 따로 묶었습니다.
그렇게 한권 한권 세월과 함께 쌓인 것이 바로 지금 남아 있는 수천 책의 승정원일기입니다.
승정원일기는 지금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역사교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왕자를 때리고도 목숨을 부지한 내시 (ft. 세종대왕) (0) | 2021.09.22 |
|---|---|
| 사약, 죽을 죄인에게 임금님이 내리는 마지막 은혜 (1) | 2021.09.19 |
| 인왕제색도와 승정원일기의 날씨 기록 (0) | 2021.09.19 |
| 객사에 모셔둔 전패는 왕을 상징하는 것 (0) | 2021.09.19 |
| 제주도의 옛이름 탐라는 무슨 뜻일까 (0) | 2021.0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