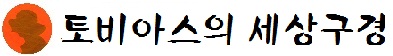몇 주 전 홍릉수목원을 다녀오면서 세종대왕 기념관을 들렀습니다.
세종대왕신도비 사진을 찍어둔 줄 알았는데 아무리 파일을 찾아도 없길래 그 사진도 찍을 겸 오랜 만에 가보기로 했지요.
세종대왕 기념관은 홍릉 바로 옆에 있습니다.
홍릉수목원 앞 삼거리의 이름도 세종대왕 기념관 교차로입니다.
세종대왕신도비에 비각을 지어 놓았습니다.
워낙 오랜 만에 찾아갔으니 이런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신도비 사진을 제대로 찍을 수 없으니 아쉽습니다.

신도비는 죽은 사람의 생전의 행적을 기록한 비입니다. 비석에 간략하게 일대기를 새기는 건데, 조선에서는 초기에 왕릉을 조성할 때 신도비를 능비(묘비)로 세웠습니다.
그러다 세종대왕 이후에는 묘비로 바뀌게 되는데, "임금의 행적은 모두 국사에 기록되어 있으니 일반 사대부들처럼 사적비를 따로 세울 것이 없다" 하는 의견 때문입니다.
왕의 생전 업적은 물론이고 일거수 일투족이 모두 실록에 기록되는데 굳이 비석에 새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종대왕까지만 신도비를 세웠기 때문에 조선시대 국왕의 신도비는 모두 4기가 됩니다. 이중 정종의 능은 개성에 있으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3기입니다.
세종대왕 신도비의 글자는 명필로 이름난 세종의 삼남 안평대군이 썼다는데 워낙 마모가 심해서 글자가 잘 안 보입니다.
하긴, 글자가 보여도 "한문이로구나." 하는 것 말고는 알 수 없겠지만요^^

그런데, 능 앞에 세웠다는 신도비가 왜 세종대왕기념관에 와있는 걸까요?
세종대왕의 능인 영릉英陵은 경기도 여주에 있는데 말입니다.
영릉은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합장릉으로 처음에는 경기도 광주 대모산(현재 서울 강남구 내곡동)에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곧 길지가 아니라는 의견이 대두되었고, 결국 예종 원년인 1469년 지금의 자리로 옮겼습니다. 왕릉을 옮기는 것을 천릉이라고 합니다.
영릉을 옮길 때 원래 있던 석물들을 운반하기가 어려워 그 자리에 묻었던 것을 1970년대 발굴했다는데, 일반 무덤도 이장하게 되면 비석 같은 것은 그 자리에 묻지 않나요? 이건 좀 더 알아봐야 할 듯.
아무튼 1970년대 발굴된 영릉의 석물들은 세종대왕 기념관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혹시, 세종대왕 기념관을 지으면서 석물들을 옮겨오려고 옛 영릉 자리를 발굴한 건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신도비는 세종대왕 기념관 입구 쪽에 있고, 좀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석물들이 줄지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 왼쪽부터 난간주석, 석마, 무인석, 석양, 문인석, 장명등과 혼유석, 문인석, 석양, 무인석, 석마, 난간주석 순서로 서있습니다. 혼유석은 장명등 뒤에 있어서 이 사진에는 안 보이네요.

장명등과 혼유석을 사이에 두고 서있는 문인석들.
풍채가 넉넉한 것이 세종대왕을 닮게 만든 건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무인석들도 마찬가지로 풍채가 좋고 다부진 느낌입니다.

왕릉이든 일반 사대부 묘든 지금껏 본 문인석, 무인석 중 덩치가 가장 크고 정성껏 조성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왕릉의 석물도 그때그때 형편 따라서 화려하고 세련된 경우가 있는가 하면 형식적으로 구색만 갖춰 놓은 경우도 있는데, 영릉 석물들은 꽤 넉넉하게 조성됐다는 느낌이네요.
여주에 새로 조성하면서 만든 석물들은 어떤지 가봐야겠습니다.
석물들 옆에 웬 묘비가 서 있는데, '한힌샘 상주 주시경 스승의 무덤'이라 새겨져 있습니다.
묘비는 있지만 봉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 세종대왕 신도비처럼 비석만 옮겨다 놓은 것입니다.

주시경 선생의 묘는 처음에 수색 고택골(현재 은평구 신사동)에 만들었다가 1960년 한글학회 주도로 경기도 양주 장현리(현재 남양주시 장현리)로 옮겼더랬습니다.
그러다 1981년 국립묘지 유공자 묘역으로 옮겼는데 비석이나 석물들은 그대로 두었다가 2008년 세종대왕기념관으로 옮겨왔다 합니다.
한힌샘은 많이 들어봤는데 상주는 뭔가 했더니, 주시경 선생의 본관이 상주라고 합니다.
영릉 석물들 가까이에 수표가 있습니다.
수표에도 보호각이 세워져 있네요.
수표는 세종 때인 1441년 청계천의 수위를 측정하기 위해 마전교에 설치했던 것이 효시입니다. 마전교는 1420년에 가설된 다리로, 수표가 설치된 뒤 수표교라 불리게 되었고 그 일대 동네도 수표동이라 불리게 됩니다.
세종 때 설치되었던 수표는 나무로 만든 것이었고, 석재 수표는 그 이후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1척부터 10척까지 눈금을 새겨 놓았습니다.

뒷면(앞면?)에는 3척, 6척, 9척 눈금에 구멍을 파놓았습니다.
어떤 용도였으려나요?

수표교는 1959년 청계천을 복개할 때 장충단공원으로 이설되었는데, 이 수표는 언제 이곳으로 왔을까요?
세종대왕기념관이 1968년 공사를 시작해 1973년 문을 열었으니, 그때 언제쯤 옮겨왔을까요?
기념관 앞에 이곳의 주인공인 세종대왕 동상이 우뚝 서있습니다.
꽤 낯익은 모습이다 했더니, 덕수궁에 있던 동상을 옮겨온 것입니다.

세종대왕 동상은 1971년 덕수궁에 세웠던 것입니다.
이 동상이 덕수궁에 있을 때 "아무 관련도 없는 곳에 왜 세종대왕 동상이 서있나?" 하는 분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조선 국왕의 동상을 조선 궁궐에 세웠는데 뭐가 문제? 할 수도 있지만, 세종대왕 시절에는 덕수궁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이런 논리면 조선 궁궐 중 세종대왕과 관련된 곳은 경복궁뿐이지만, 그래도 덕수궁은 처음부터 궁궐로 조성된 곳도 아니고, 조선이 다 망해갈 때 고종이 남의 나라 영사관으로 피신하면서부터 사용하던 곳이다보니 영.....
그래서인지 어째서인지 2012년 동상을 세종대왕기념관으로 옮겨왔네요.
어찌 보면 동상이 제 자리를 찾은 셈이긴 한데, 이곳이 과연 제자리인가 하는 회의를 하게 됩니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는 기념관을 웨딩홀로 대여해 주는 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회에서 수익 사업을 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해도,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느낌입니다.
기념관 마당이고 어디고 죄 웨딩홀과 관련된 시설만 눈에 뜨입니다.
아마도 세종대왕기념관을 예식장 쯤으로 아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네요.
기념관 안에 전시공간이 있는데,
오래 전 갔던 기억으로는 그때 이미 시설이 낙후된 느낌이었는데 지금이라고 얼마나 개선되었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무슨 기념관 같은 곳들도 세련되게 잘 운영하던데, 역사의 위인 중 위인으로 추앙받는 분의 기념관이 이리 낙후되어 있으니 안타깝습니다.
물론 돈 들여서 시설을 화려하게 짓거나 그런 걸 하자는 게 아니라 사업회의 운영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방방곡곡'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성균관에는 명륜당, 대성전 말고 또 뭐가 있나 (4) | 2019.12.03 |
|---|---|
| 하동 평사리 한산사 지나 고소성 한 바퀴 (0) | 2019.12.01 |
| 영월 장릉의 느릅나무 (0) | 2019.11.27 |
| 밀양아리랑과 아랑각 전설이 무슨 상관? (0) | 2019.11.26 |
| 밀양 영남루와 아랑각, 천진궁 그리고 밀양관아지 (0) | 2019.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