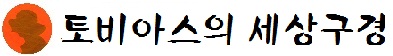고려가 기울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는 움직임이 일었을 때 고려의 사대부들 중에는 끝까지 고려에 대한 절의를 지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 데 적극 앞장선 사람도 있습니다. 이색, 정몽주, 이숭인 같은 사람은 어떻게든 고려를 유지하고자 했고 정도전, 조준 같은 사람은 새 나라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이들 중 특히 정몽주와 정도전이 대비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 주는 사이였고, 정도전에게 역성혁명의 가치를 심어 준 <맹자>를 권해 준 것도 정몽주라는데, 서로의 길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같은 시기를 살았고 같은 공부를 했는데도 이들이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된 것은 서로의 사회적 경제적 배경이 다르고, 또 정치적 신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회적 배경을 보면 한쪽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반대쪽은 가진 게 별로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려말 관리들은 음서제와 좌주문생제를 통해 관직에 진출했습니다.
음서제蔭敍制는 명문가의 후손이면 과거 시험을 치르거나 특별한 공을 세우지 않아도 관직에 나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잘난 조상 덕을 보는 제도인데, 고급관리의 자손들은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출세에 유리한 위치에 서는 겁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이네요. 이색이 처음 관직에 나아간 것도 15세에 아버지의 음덕을 입어 별장이 된 것이었습니다.
좌주문생제座主門生制에서 좌주는 과거의 시험관이고 문생은 급제자입니다. 좌주와 문생은 평생 부자지간처럼 지냈는데, 문생이 급제 후 공복을 입고 좌주를 배알하는 의례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또 문생들끼리 모임을 만들어 평생 동지로 지냈고요. 좌주문생제를 통해 막강한 학맥과 인맥을 형성한 것입니다. 시쳇말로 '그사세'군요.
이처럼 이색 계열의 사대부들이 집안을 배경으로 또 좌주와 문생의 관계로 얽혀 막강한 힘을 가졌던 반면, 정도전 같은 사대부들은 집안이 한미했고 권세가들과 딱히 인연도 없었습니다. 또 좌주문생제의 혜택도 받지 못했고요.

목은 이색 초상화, 목은영당본. 문화재청
토지제도에 대한 입장에서 이들의 차이는 크게 드러납니다.
고려에서는 관리들에게 돈이나 현물로 봉급을 주는 게 아니라 일정한 토지에 대해 세금을 거둘 권리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지급된 토지를 국가가 아니라 사인私人에게 속하는 토지라 해서 사전私田이라 했습니다. 농민 입장에서야 국가에 세금을 내는 거나 관리에게 내는 거나 정해진 대로만 낸다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권세가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서 농민들에게서 토지를 강제로 빼앗는가 하면 규정 이상으로 세금을 거두었다는 겁니다. 또 같은 토지에 대해 이 가문에서도 세금을 걷고 저 가문에서도 세금을 걷는 바람에 농민들은 심한 경우 8~9번까지 세금을 냈다고 합니다.
이런 병폐를 해결할 방법으로 이색이나 권근 같은 사람은 사전의 주인을 잘 가려서 세금을 규정대로 걷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도전이나 조준 같은 사람들은 사전 자체를 없애자는 입장이었습니다. 관리가 농민에게서 세금을 걷게 하지 말고 나라에서 직접 세금을 거두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중간 수탈을 막을 수 있고 조세수취권을 가진 중앙의 힘이 그만큼 강화되는 셈입니다.
토지제도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달랐던 것은 결국 이들의 사회적 기반이 달랐기 때문일 겁니다. 사대부 관리라고 해도 다 같은 처지가 아니라는 거지요.
이색과 입장을 같이한 사대부들은 상대적으로 부유했습니다. 이색의 경우 한산, 여흥, 개경, 장단 등 여러 곳에 토지가 있었고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토지에 자신이 받은 사전도 있었습니다. 중앙 정계의 권력자이자 대지주였던 겁니다.
하지만 정도전 같은 사람은 명색이 사대부이고 과거를 통해 정계에 진출했지만 이런 혜택을 별로 받지 못했습니다. 외려 나라에서 받은 사전마저 권력자에게 빼앗길 정도였지요. 관리도 권력자에게 토지를 빼앗길 정도면 일반 농민은 오죽했을까요.
이런 배경들을 생각하면 이들이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된 것은 당연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고려를 지키려 했던 사람들이 불의고 뭐고 내 이익만 챙기겠다는 생각은 아니었을 테지만, 세상이 뒤바뀌는 시절에는 많이 가진 사람이 보수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요? 물론 기득권은 별로 없지만 끝내 고려에 절의를 지킨 사람이나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사상차이로 인한 신념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요.

2014년 KBS에서 방영한 사극 정도전
고려를 지키고자 했던 이들과 새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이들은 무엇보다 사상의 차이가 컸습니다. 함께 주자학을 공부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느냐에 따라 입장이 나뉘었던 게지요.
유교에서는 예禮를 구성하는 원리로 친친親親과 존존尊尊이 있다고 합니다.
친친은 혈연관계를 중시하는 것입니다.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사회관계를 설명하고 혈연에 의한 인정이나 사사로운 정감을 중시한다고 합니다.
존존은 혈연보다는 2차적인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사회관계를 설명한다는군요.
서로 강조점이 다른 것인데, 고려를 지키고자 했던 이들은 친친을 중시하는 입장이었고, 조선 개국파는 존존을 강조하는 입장이었다네요.
유학을 공부하지 않은 저로서는 좀 어려운 개념인데, 제 식으로 단순무식하게(^^) 이해를 하자면
고려파의 입장은 대의보다 사적인 인정을 강조하는 입장, 즉 공적인 관계보다는 혈연을 중시하는 것이고
개국파의 입장은 공적인 관계, 사회적 명분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이 강조점이 달라지면 군신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입장도 달라집니다.
이색을 비롯한 고려파에서는 군주를 절대적인 존재로 봅니다. 군신의 관계를 피로 맺어진 혈연관계와 같다고 보는 겁니다. 군신의 관계란 부자관계와 같은 것이니 절대 끊을 수 없고, 그래서 고려의 문제점을 뻔히 보면서도 그 왕조를 부인하지 못하고 절의를 지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많은 문제점이 쌓이고 쌓여 무너지는,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선 왕조임에도 끝까지 충절을 바치는 정몽주 같은 사람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갑갑해 보일지 몰라도, 저 당시에는 왕이 곧 나라였고 절대적인 존재였으니 개혁을 하면 했지 새 왕조를 만든다는 데 찬성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게되는 지점이지요.

포은 정몽주 초상. 문화재청
하지만 조선 개국파의 입장은 대의명분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혈연에 기반한 사적인 가치를 좇을 게 아니라 천명과 인심을 따르는 대의에 명분을 두는 것이지요. (대의와 명분. 조선을 배경으로 한 사극에서 참 많이 듣던 말이네요.)
이 입장에서는 군주라고 해서 무조건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대의명분에 맞는 군주가 정통인 것이고 충성을 바칠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대의에 맞지 않는 군주가 있다면 고치고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우왕과 창왕을 몰아내고 이성계가 즉위한 것도 이 논리에 따른 것이고요.
결국 1392년 7월 고려의 문을 닫으며 조선이 개국되었습니다. 끝까지 고려를 고집하던 이색 등은 새 왕조의 죄인이 되었고, 정도전, 조준 등은 조선의 개국공신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500년을 이어오던 왕조가 무너지고 새 왕조가 들어서던 시기에 어떤 이들은 망한 왕조의 충신으로 남았고 어떤 이들은 새 왕조의 개국공신이 되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학문을 공부했음에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사상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현실에서의 태도 또한 달라진 것입니다.
'역사교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단종실록과 노산군일기 (0) | 2021.09.19 |
|---|---|
| 서울에 남아있는 조선 5대궁궐 (0) | 2021.09.19 |
| 전주 남문 풍남문 이름은 풍패지관에서 비롯된 것 (0) | 2021.09.19 |
| 박충원이 단종의 묘를 수습했다고? (0) | 2021.09.19 |
| '난중일기'와 '이충무공전서'와 '임진장초'와 국보 76호 (0) | 2020.08.06 |